
그리하여 흘려 쓴 것들
이제니
전에 읽었을 때는 빽빽한 시들이 잘 안 읽혔는데 이번에 다시 잡으니까 전보다 더 집중해서 시를 따라갈 수 있었다.
처음 읽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언젠가 가게 될 해변>이 좋았는데 난 일단 '해변'이라는 장소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음. 해변, 하면 이미 사랑할 준비가 되어있어 버림.

쇼팽 노트 : 가장 순수한 음악
앙드레 지드
쇼팽 연습곡들 각각에 대한 지드의 해석(?)이 좋았다. 지드가 콕 집어 얘기하는 부분 악보가 실려 있어서 눈으로 따라가며 이해하기도 더 좋았고. 곡 들으면서 읽으니까 음악이 한층 더 와 닿는 느낌.
피아니스트들의 리스트적인 쇼팽, 기교적인 쇼팽 연주를 싫어한 지드.
낭만적이나 단순히 흥건한 낭만뿐인 게 아니라 그 낭만이 결국 고전의 견고한 세계로 돌아간다는 쇼팽.
지드의 쇼팽 최애곡 중 하나는 바르카롤.
지드의 일기도 실려 있는데 바그너에 대한 멘트 요청받고 바그너 싫다면서 그는 지금껏 독일이 낳은 것 중 가장 야만적이고 천재적인 것 어쩌고 한 말이 재밌었다.

종이 동물원
켄 리우
표제작 종이 동물원 읽으면서 또르르 눈물 고임. 그런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너무 우리 엄마 자식새끼 1이라면 울 수밖에 없는 치트키였음.
종이로 만든 동물들이라는 소재 자체도 좋았고 학으로 접어 죽은 이에게 날리는 편지, 중국에서 축제날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종이 용들, 만든 이의 숨을 불어넣어 움직이는 종이 동물들, 등등 자연스럽게 나오는 환상적인 것들도 이야기와 잘 어우러지면서 좋았음. 죽은 이들과 산 자가 닿는 청명절, 편지, 한자로 쓰는 '사랑' 이런 것도.

캄포 산토
제발트
"피에르 베르토는 삼십 년 전에 이미 인류의 변화를 내다보면서, 기억과 보관과 유지는 주거지의 밀도가 낮은 시대에만, 즉 우리가 만들어낸 물건들이 많지 않은 데 반해 공간만은 넉넉했을 시대에만 삶의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는 기억과 보관과 유지 중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었고 그건 죽은 뒤라 해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누구든 한 시간이면 족히 타인에게 갈 수 있고 대체 가능한 존재로 사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구 과잉에 기여하는 20세기 말 도시의 삶은, 불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내다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모두, 가령 청소년 시절, 유년 시절, 출생, 선조와 조상을 남김없이 잊는 것으로 귀착된다. (...) 과거 전체는 형체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는 말 없는 덩어리가 되어 녹아 없어지리라. 그러면 우리는 기억이란 것을 알지 못하는 어느 현재를 살아가면서, 또 아무것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하면서, 종국에는 잠시라도 머물고 싶은 또는 가끔씩이라도 되돌아오고 싶은 마음조차 품지 못한 채 삶 자체를 놓아버리게 되리라."

아무도 아닌, 동시에 십만 명인 어떤 사람
루이지 피란델로
그냥 글자만 읽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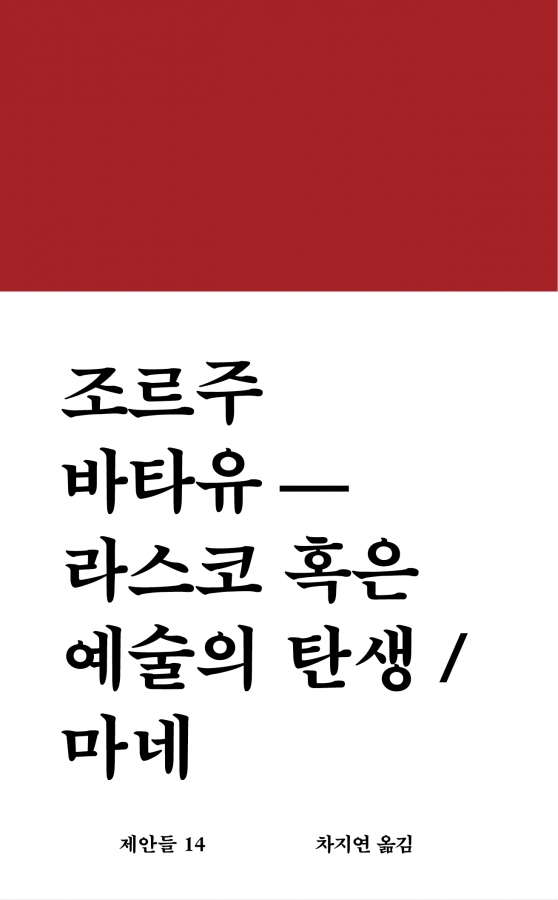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탄생 / 마네
조르주 바타유
재밌었음.
동굴이나 동굴 벽화에 끌려서 라스코 얘기 보려고 빌렸는데 같이 실린 마네가 더 재밌었음.
최초의 현대적인 화가 마네.
비개성, 객관적인 태도가 주는 세련미.
주제의 의미화에 무관심한 태도, 웅변의 부정.
구시대적인 위엄이나 귀족성 없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와 무심함.
현대 회화의 세계 탄생을 고한 화가.
타인들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스스로 결정하다.
"결국 마네의 작품들에서 주제는, 파괴된다기보다는 초월된다."

괴도 신사 뤼팽
모리스 르블랑
심심하던 차 갑자기 눈에 뜨여서 읽음. 재밌었다.
아르센 뤼팽 대 헐록 숌즈
어릴 때 셜록 먼저 봐서 그런지 "나의 셜록은 이렇지 않아!" 하는 과몰입 오타쿠가 되어 씩씩거리면서 봄. 솔직히 여기 숌즈는 너무 하지 않나. 내가 코난 도일이어도 빡쳤다.
기암성
짱잼. 뤼팽 대 숌즈의 숌즈는 솔직히 뤼팽의 대립캐로서의 매력을 못 느꼈는데 여기 이지도르는 매력이 있었다. 일단 어리고 준수한 소년이라는 게 큼. 현실에서의 잘생김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한낱 글자 쪼가리여도, 그리고 꼭 '미남'이라고 못 박지 않아도 대충 잘생긴 것 같은 뉘앙스만 풍겨도 나 같은 독자는 확실히 인물에 대해 마음이 열려버림. 잘생겼다는 것의 엄청난 위력.
마리 앙투아네트 편지도 좋았다. 왜 이제야, 하는 왕비의 탄식. 성경책에 쪽지를 숨겨 페르젠에게 그 비밀을 전하지만 페르젠은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고.
숨겨진 역사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설정을 좋아한다. 이런 거 잘 쓰면 너무 좋지 않나. 기암성 얘기는 아니지만 독자가 책을 읽음으로써 남들은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뭔가 묘하게 찌르르한 게 있음. 내가 알게 된 그 비밀이 사실이 아니라 한낱 책 속의 가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모를 진실에 닿은 것 같은 그 느낌.
또 이지도르랑 뤼팽의 대결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지켜보고 웅성거리는 그런 분위기도 재밌었다. 언론전의 매력.
어릴 때 기암성 내부 묘사에 홀렸었는데 다시 읽어도 이 부분이 설렜다. 속이 빈 바늘 모양의 거대 바위 성,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나타나는 가득한 보물들.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방. 마지막 방에서 과거의 인물들이 가져다 써서 텅텅 빈 보석 상자 보여주다가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물들이 나올 때.
놀랐던 건 어릴 때 읽은 오래된 아동용 판본에서는 뤼팽이 여자와 함께 떠나는 장면으로 끝났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였다!
뤼팽이 자신이 이룬 그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함께하려 했던 그 여자가 너무 허무하게 숌즈의 총에 맞아 죽고 여자의 시체를 안고 떠나는 뤼팽이라니. 이 엔딩이 더 마음에 남는다. 아동용이랍시고 원작을 자기들 입맛대로 훼손하는 거 너무 싫다. 아이들이 스스로 읽고 느낄 수 있게 내버려 뒀으면.

괴괴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
임솔아
<예보>가 좋았다. 한 편을 다 읽었을 때 뭔가 이상하게 산뜻한 느낌.

장식과 범죄
아돌프 로스
재미없는 듯 재미있었다. 요즘은 건축에 관심이 간다.
장식은 지난 시대의 예술적 배설물의 징표이며 문화의 진화는 일상용품에서 장식을 멀리하는 것.
우리는 장식을 극복했고 고민 끝에 이제 '장식 안 함'을 결정한 세대.
현대적인 신경이 견뎌낼 수 있는 것과 견뎌낼 수 없는 것.
읽으면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엄마보다 1870년생인 아돌프 로스가 더 '모던'하다고 느꼈다. 엄마의 인테리어 취향 너무 장식적임. '현대적'인 '신경'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아름다움은 형태에서 구할 뿐, 장식에 얽매이지 않음은 전 인류가 추구해온 목표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적인 문화와 외적인 문화의 연관성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란 신은 예술가를 창조하고, 예술가는 시대를 창조하고, 그 시대는 공예인을 창조하며, 그 공예인은 단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
갈수록 소설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 '장르' 소설은 괜찮은데 막 '순문학'이라고 하는 소설에는 별로 손이 안 간다.
요즘은 시, 음악, 미술, 건축 관련 책 읽는 게 재밌다.
'감상 >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움베르토 에코 유작 에세이-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 하는 방법 (0) | 2021.03.02 |
|---|---|
| 박솔뫼 신작 소설집-우리의 사람들 (0) | 2021.02.28 |
| 키케로의 <우정에 관하여> 읽고 잡생각 (0) | 2020.02.26 |
| 배반자의 글과 분리되지 못한 글-<아버지의 자리/어떤 여인>, 아니 에르노 (0) | 2020.02.21 |
| 사과하지 않는 '타락한 영화의 신'-<레니 리펜슈탈: 금지된 열정>, 오드리 설킬드 (0) | 2020.02.02 |



